섬과 섬 사이 하늘에는 케이블카를 연결하여 사람도 하늘에 둥지를 틀어 나는 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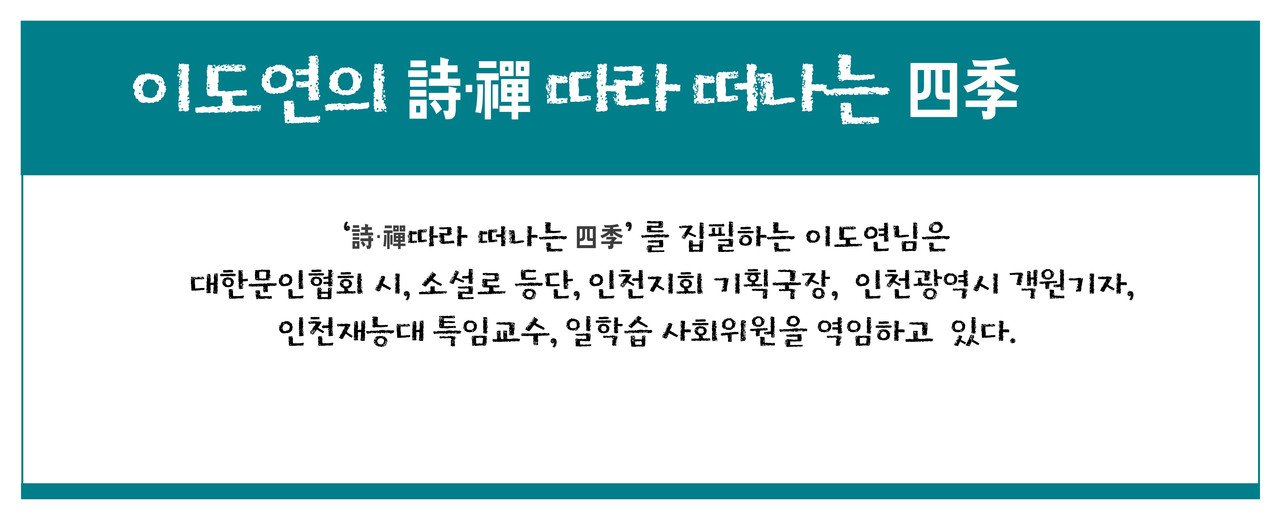
길게 이어진 철로를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ktx 산천의 꼬리가 부드럽게 승강장을 빠져나간다. 여행의 시작은 아침 햇살처럼 투명하게 시간을 이어가고 열차의 승차감은 부드럽고 순하며 가볍다. 푸르른 하늘의 맑고 파란 창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겨울의 앞마당을 닮았다.
구름의 형상이 아침 마당에 비질을 한 듯 쓸어 모아 하늘 여기저기 쌓아 놓았고 때로는 정갈하고 깔끔한 순백의 화선지가 되어 다양한 문양의 그림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한다.
눈앞에 보이는 넓은 들판 사이에 올망졸망하게 자리를 잡은 산들은 낮게 들판에 엎드려 논과 밭을 가로지르며 길게 이어지다 서서히 산세의 줄기를 불려 높게 일어서기도 하며 열차의 창 가까이 달려 들어와 열차와 나란한 동행을 하기도 한다.
먼발치에서 보이는 산들은 구름을 머리에 이고 돌처럼 검은빛의 단단한 모습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득한 남도의 땅으로 지세를 모아 산맥을 이루며 열차를 따라 힘차게 뻗어 내리며 달려간다.
창밖으로 지나는 풍경의 변화가 다채로우며 빠르게 지나갈수록 역과 역의 간격은 짧았으며 실개천의 지류가 모여 호수가 되고 강이 되어 흐르다 열차의 속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다 얼굴을 다시 드러내 강가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의 외로움은 한 방울 떨어지는 눈물처럼 습기만 남기고 빠르게 사라져 간다.
열차는 숨 가쁘게 달려가다 잠시 숨결을 고르며 남도의 다도해를 향해 시간의 간격을 좁혀 달려 내려와 여수엑스포역에 이른다. 정오를 지난 역에는 뜨거운 백색 광선을 뿜어내며 달구어져 있던 공기가 현관문을 밀치고 들어와 턱밑까지 후끈하게 밀고 들어온다. 역 광장에 설치된 엑스포 기념탑과 조형물이 철 지난 계절처럼 낯설게 다가온다.
여수에서 처음 만난 택시 기사의 밝은 미소가 여수에 대한 첫인상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했다. 주변 관광 명소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나이 드신 기사님의 친절에서 비릿한 항구의 냄새가 물씬 풍기었다.
종포 해양공원은 부두 옆 해안선을 따라 깊숙하게 드러누워 끝이 보이지 않았고 방파제 옆으로 수없이 많은 선박이 줄지어 서로를 결박하고 잔물결 따라 삐걱 삐걱 뱃노래를 부르고 있다.

파란 하늘 밑에 눈이 시리게 펼쳐진 남도의 바다의 싱그러움이 돌산도를 이어 달리는 현수교의 첨탑에서 빛으로 반짝이며 섬과 섬 사이 하늘에는 케이블카를 연결하여 사람도 하늘에 둥지를 틀어 나는 새가 되었다.
바다는 넓고 좁았으며 섬 사이를 서로의 물거품으로 밀어내며 지나가는 어선과 유람선이 뱃고동을 울렸고 유행가를 부르며 넓은 바다로 달려 나가고 달려들었다.
종포 해양공원을 지나자 교차로 중앙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고 광장에 거북선 모양의 전시관이 있는 이순신 광장이 파란 하늘에 빛을 반사하며 넓게 펼쳐져 있다.

전시관 안에는 밀랍 인형으로 병졸과 장수들이 거북선 내의 구조와 생활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 놓아 숙연하고 경건했다.
장수와 병졸들은 말이 없고 삶과 죽음을 가르는 남해의 섬과 섬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 장면과 함성이 고스란히 들려왔다.
중앙로를 끼고 돌아 오르자 전라좌수영, 삼도수군통제영 건물인 진남관이 나온다.
진남관은 남쪽의 왜구를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의미로 임금을 가까이 모시듯 예를 올리며 선정을 맹세하던 곳으로 왕명을 받들거나 사신을 영접하던 곳이었으나 장군도 사신도 없는 썰렁한 건물이 길을 막았다.
아쉽게도 진남관은 공사 중이라 둘러볼 수가 없었고 아래 유물전시관에서 임진왜란의 아프고도 용맹한 장군의 활약과 역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다.
진남관 옆 우측으로 좌수영 다리를 지나 언덕을 오르며 벽화를 보며 임진년의 세월을 거스르다 보면 쪽빛 하늘 아래 고소대가 단아한 모습으로 눈에 들어온다.
이순신 장군이 군령을 내리던 장대로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통제이공수군대첩비가 있고 노량 해전에서 장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부하들이 세운 타루비가 있다.
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타루비의 눈물은 마르고 수백 년 도읍의 국운을 걱정하던 장군의 군령 대신 커다란 느티나무만 뭉게구름 피어오르는 하늘을 머리에 이고 물빛 눈물을 바람에 날리고 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붉은빛에 둥근 원형의 알 수 없는 건축물이 폐허처럼 서 있다.
예전에 포를 쏘아 정오를 알리던 곳으로 이후에는 사이렌으로 대신했고 세월이 지난 지금의 오포는 침묵하고 하늘 가까이 뜨거운 태양만 오포를 대신해 정오를 알린다.
작렬하는 정오의 햇살을 등지고 내려가는 길에 폭염 쉼터라는 메모를 발견하고 걸음을 옮기자 이순신 전술 신호 연 박물관에 이르러 문을 열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더 반갑다.
전술 신호 연 전승자분들이 열심히 연을 만들고 계신다. 연의 형태, 문양, 숫자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하는 장인의 다문 입술에서 그날의 비장함을 엿본다.
매일 한 차례 이순신 광장에서 메아리 없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연은 하늘에서 펄럭이고 바람의 울음소리를 낸다.
'스토리마당 > 이도연의 시선 따라 떠나는 사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엇을 많이 먹으면 죽을까요? (0) | 2023.03.17 |
|---|---|
| 벗에게 (0) | 2023.03.03 |
| 서해의 바다에 세월을 묻다 (0) | 2022.10.01 |
| "거진항", 아버지의 바다! (0) | 2022.09.30 |
| 영혼의 소리가 존재하는 그리움의 바다 (1) | 2022.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