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우리 위에 둥실 걸려있는 달빛은 수줍은 물빛으로 빛나니 그 자체가 한 폭의 수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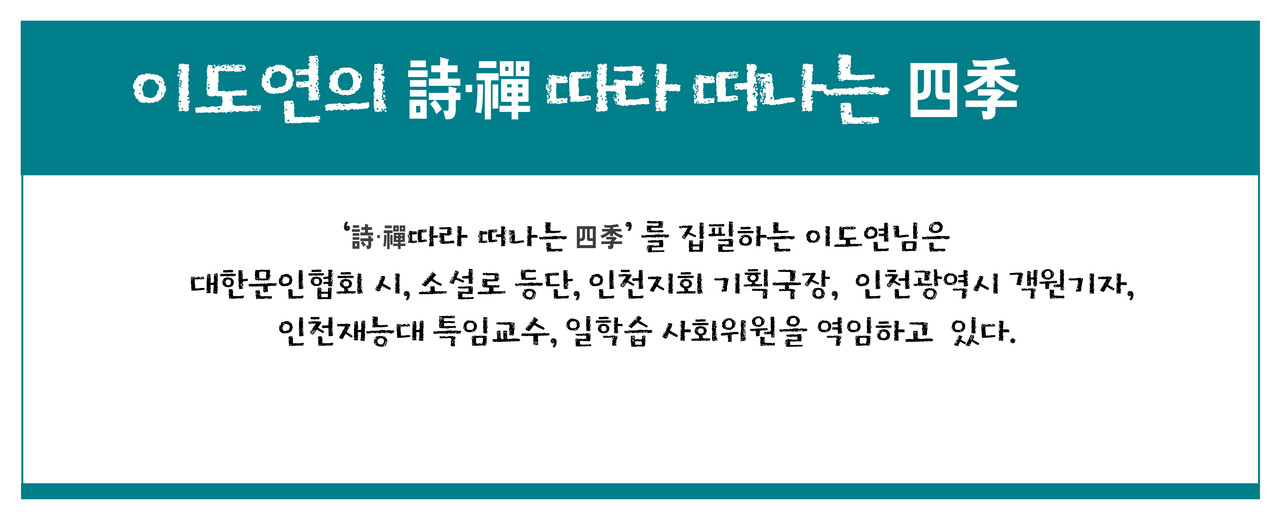
띠리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든 시간이라고 자만하던 휴대전화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울리고 힘겨운 하루를 재촉하며 자신만의 목소리로 휴대전화는 자랑스럽고 요란스럽게 모닝콜을 하며 주인의 단잠 속으로 끼어든다.
어제 늦은 저녁에 마신 커피 탓인지 밤새워 뒤척이며 잠이 안 오던 차에 잠시 깜빡 잠든다 싶었으나 조용한 정적을 흔들며 아침 여명에 깜짝 놀라 아침을 열자니 요란스럽고 수다스러운 그 녀석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하루를 일으켜 세운다.
새벽 04:30분 기상 06:00까지 역에서 충북 영동 월류봉으로 출발하는 버스를 타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파랗게 날이 서 있는 푸른 새벽에 긴장감으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부지런히 집을 나선다.
다섯 시가 조금 넘은 이른 새벽 공기가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나만의 발걸음 앞에 암청색으로 일어나고 붉은빛으로 세상의 아침을 여는 푸르른 여명을 바라보며 게으른 새벽의 아침이 숲속에서 불어는 신록의 녹음으로 시원하다.
저마다 주어진 시간과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림자가 아닌 현실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소리를 내며 아침 공기를 가르며 달음질치고 드문드문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갈 곳을 잃어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저마다 타고난 더듬이가 있는지 유전적인 방향 감각으로 시베리아를 넘는 조류의 뇌파에 각인된 선천적 오감을 작동하며 주말 새벽에 어디로 가는지 바쁘기만 하다.
출발 시각을 넘긴 버스가 꾸물거린다.
한두 사람이 도착 시간보다 늦어지는 모양이지만 무정한 버스는 네 바퀴를 지면에 밀착하고 비정하게 야위어가는 시각에 미안하거나, 당혹스러워하지 않으며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시간 속으로 타들어 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람처럼 고독과 외로움으로 말라가는 들풀처럼 바람에 초연하며 시간을 묻는다.
출발을 지연한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집행부는 속이 타들어 간다. 간다는 사람 조금 늦는다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기다리려니 전체 일정이 바빠지고 옛날 산악회를 운영하던 시절이 생각나 집행부의 고초를 이해할 만하다.
좀 일찍 부지런히 나서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다. 국도를 잠시 달리다 외곽순환도로를 들어서 시원스럽게 달린다. 주말이지만 이른 아침이라 막힘없이 두 시간 반을 조금 달려 황간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 목적지인 월류봉 입구 주차장에 도착한다. 차창 넘어 정면의 봉우리가 마이산처럼 우뚝 솟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등산로 들머리를 초입 산행을 시작하자 바로 급한 경사로가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햇살은 구름 속에 숨어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지만 공기는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다.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제일봉에 올라서자 금강 상류 지류인 초강천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 따라 운해가 흐르는 산골 마을은 신선들이 사는 선계의 세상이다.
제일봉에서 오봉 사이로 펼쳐진 눈앞의 절경에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산 아래 아득하게 보이는 산세가 한반도의 지형을 그대로 빼다 박은 모습이고 초강천 맑을 물이 반도를 감싸 흐르는 것이 마치 동해와 서해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를 닮았다.
일봉, 이봉, 오봉에 이르기까지 올망졸망한 급경사와 때론 완만한 능선으로 이어져 산행길이 아기자기하게 늘어서 즐거움에 가슴이 부푼다. 경사로를 오르는가 싶으면 편안한 능선 길로 이어지고 땀이 흐른다 싶으면 때마침 시원한 산들바람 불어와 상큼한 풀 향기로 그윽하다.
오봉 갈림길에서 사슴농장 반대쪽 징검다리 방향으로 길머리를 잡으니 비교적 급경사이지만 조금씩 몸을 사려가면서 밧줄을 잡고 내려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경사면 끝머리에서 들려오는 파란 물소리가 눈을 먼저 반긴다. 제법 넓은 초강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의 멋스러운 모습보다 옛날 삐뚤빼뚤하게 놓여 있었을 어줍잖은 징검다리가 그립다.
하얀 모시 적삼 걷어 올리고 불어난 하천을 조심스레 건넜을 그 옛날 선비의 발걸음을 따라가 본다. 맑은 물아래로 떼 지어 다니는 송사리가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사이로 눈부시게 움직이고 수초 뒤에 숨죽인 다슬기가 청정지역임을 말한다.
징검다리 건너 뒤돌아보니 실구름 사이 청아하게 맑은 하늘과 절벽으로 꺾여 웅장한 병풍을 세워 놓은 월류봉이 한눈에 잡힌다.
황간면 원촌리에 깎아지듯 서 있는 월류봉의 여덟 경승지를 한천팔경(寒泉八景)이라 부른다고 한다. 가히 허언이 아닌 아름다운 절경이다.
조선 숙종조의 대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선생이 머물던 한천정사(寒泉精舍)에서 이름을 따왔다 한다.
월류봉 정상에 걸린 달이 하얗게 반짝이는 백사장 위를 흐르는 맑고 깨끗한 초강천과 만나 은은히 비추고 봉우리 위에 둥실 걸려있는 달빛은 수줍은 물빛으로 빛나니 그 자체가 한 폭의 수묵화다.
달도 머물고 간다는 월류봉(月留峰!) 송시열 선생이 바라보던 그달이 세월의 강을 건너 지금도 고고하게 흐르는 달빛이라 은한(銀漢)이 달밤 같은 시 한 수 절로 아니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청산(靑山)도 절로 절로
녹수(綠水)도 절로 절로
산 절로 수절로 산수 간에 나도 절로
그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중략~~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자연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깨우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시조의 뜻을 음미하며 월류봉 달빛을 마음속에 그리며 길을 재촉한다.
달빛도 밝고 달빛을 담고 있는 강물도 맑은데 세상 번뇌로 가득한 내 마음은 맑지 못하니 이곳 강물에 유유히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스토리마당 > 이도연의 시선 따라 떠나는 사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꿈꾸는 장호항 (1) | 2022.09.02 |
|---|---|
| 못다 이룬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해신당 공원 (0) | 2022.09.02 |
| 산사의 새벽 종소리, 백련사 (0) | 2022.07.04 |
| 소리의 바다를 듣는다 - 죽녹원 (0) | 2022.06.08 |
| 누구나 시인이 되고 우수에 찬 사슴 눈망울을 닮게 하는, 섬진강 (0) | 2022.06.03 |








댓글